인천시 창영동에는 우각현, 우리 말로 '쇠뿔고개'라 불리는 야트막한 언덕이 하나 있다.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지금으로부터 한반도 최초의 철도, 바로 '경인선' 기공식이 열린 곳이다. 공사를 시작한 것은 1897년 미국인 제임스 모스에 의해서였으나 자금난으로 철도 부설권이 일본인에게 넘어가면서 경인선은 결국 1899년 일본인의 손으로 완성됐다.
철도와 기차는 근대성의 상징이었다. 그 전까지 다소 불명확했던 시간 관념이 시와 분 단위까지 명확해지는 계기가 됐고 국제적으로는 '세계 표준시'도 만들어졌다. 사람과 물자의 대량 수송도 가능해졌으며 정보 교류의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그러나 이 땅에 놓여진 철도는 근대성을 실어나르기보다는 '침략과 수탈의 수단'으로 이용된 측면이 크다. 그들은 철도 용지를 거의 무상으로 이용했고 철도 용품이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다. 건설 과정에서 논과 밭의 곡물을 마음대로 베어내는 등 수많은 횡포를 부리기도 했다. 임금 부분에서도 일본인 노동자가 하루 60~100전을 받은 반면 같은 일을 한 조선인 노동자가 받은 임금은 그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1904년 경기도 시흥 주민 만여 명이 당시 군수와 그의 아들을 살해하기까지 한 이유도 그런 횡포에 있었다.
일본은 그렇게 놓은 철도를 이용해 이 땅에서 생산된 쌀과 목재, 석탄 등 농수산품에서부터 지하자원까지 각종 자원을 일본으로 반출해 갔다. 예컨대 철도를 이용해 약탈해 간 쌀의 양이 1911년 7만6천여 톤에서 27년 뒤인 1938년에는 약 14배인 108만7천여 톤으로 증가하는 등 수탈량은 해가 갈수록 늘어만 갔다. 대륙 침략을 위한 발판으로 이용된 것도 물론이다.
그런 아픔을 안고 탄생한 한국의 철도…. 그러나 지금은 국토가 그렇듯 철도 역시 남북으로 단절된 상태다. 끊겼던 경의선과 동해선이 지난 2009년 연결되기는 했지만 다시 쓸모 없는 철도마냥 버려져 있는 게 현실이다. 애초 수탈과 침략을 목적으로 놓여진 철도였지만 남북을 오가며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메신저가 될 가망은 없는 것일까. 쇠뿔고개에서의 잡감은 그래서 더 쓸쓸한지도 모르겠다.
/'다시 서울을 걷다'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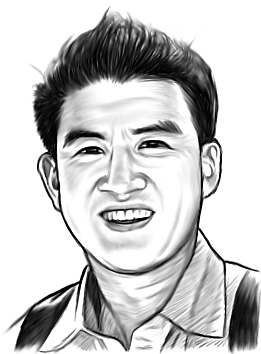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