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사태 이후 이왕이면 일본산 식재료를 쓰지 않고 있다. 일본 여행도 웬만하면 자제하고 있다. 어느 정도 조심하면 방사능 피폭은 나의 일이 아니며 나아가 한국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전 서울 종로구 운니동에 있는 '합천 평화의 집' 서울사무국을 방문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보통 '피폭자'라고 하면 후쿠시마 원전 근처의 주민들이나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미군의 원폭을 맞은 사람들 혹은 체르노빌 원전 피해자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피폭자가 그곳에만 있는 건 아니다. 태평양 한복판의 비키니섬에도 냉전시절 서방선진국들의 핵실험 때 방사능 먼지를 뒤짚어 쓴 이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곳…. 경남 합천군에도 적잖은 수의 피폭자들이 살아가고 있다. 바로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끌려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다가 피폭당한 이들과 그들이 낳은 2~3세 후손들이다. 원폭 투하 당시 전체 피폭자의 약 10퍼센트에 달하는 7만 명 정도가 피폭됐을만큼,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전쟁이 아니었음에도 엄청난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
문제는 전쟁이 끝난 뒤 귀국한 피폭 생존자들의 정확한 규모는커녕 실태조차 정확히 밝혀진 게 없다는 데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의료지원이란 게 있을 리 만무하다. 방사능 피폭이 유전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도 조사된 것이 없어 피폭자 가운데 상당수는 후손들에게 미칠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우려해 그저 숨죽인 채 살아가고 있다.
한국 정부가 쉬쉬하는 사이 원죄국가인 일본은 특별조치법이나 원폭의료법, 피폭자원호법 등을 제정하기는 했지만 구제대상을 일본인으로만 한정했고, 지금은 '세계 유일의 피폭국'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폭을 떨어뜨린 미국도 무신경하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보다 못한 사회운동가와 종교인 그리고 시민들이 나서서 지난 2010년 피폭자와 그 후손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벌이고자 '합천 평화의 집'을 세웠다.
피폭을 바다 건너 일이라 생각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잊지 말아햐 할 것은 한국이야말로 세계 제2의 피폭국가이며 동시에 피폭 문제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설계수명을 넘겨서까지 가동 중인 부산 기장의 고리원전 관련 뉴스를 쉬이 흘려듣지 못하는 이유다.
/ '다시,서울을 걷다'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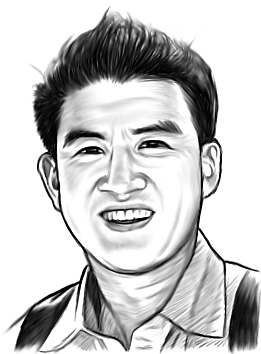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