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시 서소문청사 13층에 마련된 정동전망대에 올라가 봤다. 경운궁[덕수궁]을 비롯해 정동 일대는 물론 멀리 서울광장 일대가 한 눈에 들어왔다. 명소별 설명이 담긴 안내문도 있어 이 일대의 어제와 오늘을 조망하기에 맞춤했다. 특히 경운궁 대한문 앞에서부터 정동제일교회와 돈의문 터까지 이른바 정동 일대는 이 땅의 근현대사가 녹아 있는 장소여서 전망대의 의미가 남달랐다.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도 눈에 띠었다. 대한문 앞에 있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천막 분향소는 이제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4월 서울 중구청이 모두 철거해 버린 탓이다. 그 자리에는 다시 천막을 치지 못하게끔 대형 화단이 조성된 상태다.
참 아이로니컬했다. 중구청은 그 천막들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지만 당시 중구청의 행위도 지극히 탈법적이었다. 대한문 앞은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이기에 만약 그곳에 화단을 조성하려면 먼저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중구청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탈법이 불법을 나무란 꼴이었다.
정동전망대에서 내려와 농성 천막이 있던 곳으로 향했다. 그 어디에서도 지난 2009년 왜 3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공장을 떠나야만 했는지, 왜 24명의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노동자들이 대한문 앞에 천막을 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고민은 엿보이지 않는다.
물론 왜 꼭 공공장소에 농성장을 차려야 하는지 불편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약자인 해고 노동자들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광장과 거리'는 벼랑 끝에 놓인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장소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들, 용산참사 유가족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 그리고 경남 밀양의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서울로 올라와 대한문 앞에 이른바 '함께 살자 농성촌'을 만들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임시시설'이라며 만들어 놓고 1년이 넘도록 그대로인 대한문 앞 화단... 과연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를 꽃밭으로 대치해버리는 이 사회를 정상적인 사회라 할 수 있을까?
/'다시,서울을 걷다'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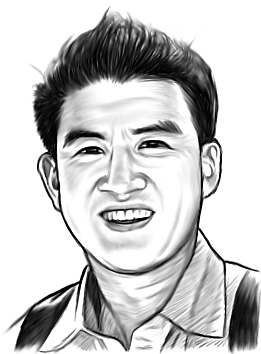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