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이런 이야기가 돈 적이 있다. 서울의 백악산은 '대(大)'자 형상을 하고 있으며, 광화문 자리에 있던 조선총독부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일(日)'자를 닮았고, 경성부청사는 '본(本)'자를 의미했다고 말이다. 일제가 이 땅을 지배하던 시절 조선인의 기를 꺾기 위해 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와 경성부청 건물을 일부러 '대일본' 모양으로 설계했다는 이야기다.
자연물인 백악산은 논외로 치고, 지금은 철거해버린 조선총독부의 경우 위에서 내려다 보면 '日'자를 닮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러 그렇게 지었다는 증거는 없다. '日'자형 건물을 비록해 '입 구(口)'자나 '눈 목(目)'자, '밭 전(田)'자 등 건물 한복판에 정원을 둔 중정식 건물은 근세 부흥식, 즉 네오 바로크식 건축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다. 비단 일제강점 하의 조선에서만이 아니라 19세기 후반의 유럽식 건물에서 흔히 발견되는 모습이다.
서울시청사를 거쳐 현재 서울도서관으로 이용되는 옛 경성부청사도 그렇다. 위에서 보면 '本'자를 닮기는 했다. 하지만 태평로쪽은 변이 길쭉한 반면 무교로 쪽은 꽤 짧다. 국호 '일본'을 드러내기 위해 '本' 자를 닮게 짓는다면서 길이가 비슷하지 않았다면 아마 꽤 불경스럽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사실 경성부청사를 지을 때 '本'자를 본따 설계했다는 이야기는 일제강점기의 어떤 기록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도리어 건물 설계에 참여했던 조선총독부 건축과의 사사 케이이치는 '궁(弓)' 모양, 즉 활대를 닮게 지으려 했다는 증언을 남겼다. 실제로 근처 건물에서 내려다 보면 서울광장을 향해 한껏 활시위를 당긴 모양을 하고 있다.
백악산과 조선총독부, 경성부청사가 한자 '大日本'을 닮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조선총독부 청사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던 때로, 총독부 철거를 부르짖던 이들의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용된 이야기에 불과했다.
설령 조선총독부와 경성부청사를 지을 때 실제로 '대일본'을 형상화하려 했다 해도, 제 아무리 부정적인 유산이라고 해도, 그것들을 헐어버린다고 해서 일제잔재가 청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독일이나 중국이 부정적인 내용의 역사유산이라고 해도 일부러 보존하고 남겨 교훈으로 삼는, '기억의 의무'를 중히 여기는 이유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들이 유대인수용소나 정치범수용소 그리고 일본군에 패한 전적지들을 없애지 않고 잘 보존하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그 역사가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해서다.
/'다시,서울을 걷다'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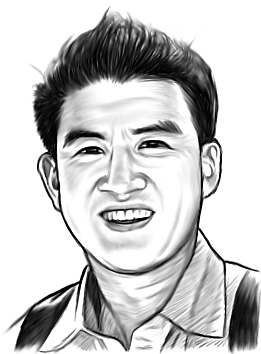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