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도성 북쪽 너머에 있는 부암동은 서울에서도 자연 환경이 빼어나기로 이름난 곳이다. 그 중에서도 부암동 주택가 뒤쪽으로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백석동천' 혹은 '백사실'이라 불리는 계곡이 있다. 지금도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도룡뇽과 버들치, 가재 등이 서식할 정도다.
그렇다고 자연만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계곡 사이의 '白石洞天'(백석동천)과 '月巖'(월암) 등의 바위 각자가 친근하게 느껴진다. 'L'자형 사랑채와 '一'자형 안채가 있던 한옥 터와 육각 정자의 주초석, 돌계단, 인공 연못 등이 남아 있는데 아마도 별서(別墅)가 있던 곳으로 추정된다. 별서는 자연 환경이 뛰어난 곳에 살림집과 정자, 대(臺)를 함께 구성하는 일종의 교외 별장 같은 공간이다.
다만 이 경치 좋은 계곡의 별서 주인이 누구였는지는 제대로 밝혀진 게 없었다. '오성과 한음' 이야기의 오성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백사 이항복 선생이 살아 백사실로 불린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와, 1970년대 들어 서울시가 발간한 의 "1830년대에 중건되었다"는 기록, 일제강점기였던 1935년에 찍은 사진 뿐이었다.
그러다 2012년경 이 별장의 주인이 추사 김정희 선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옛 문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사의 에 "옛 사람이 살던 백석정(白石亭)을 예전에 사들였다"는 내용과 "나의 북서(北墅), 즉 북쪽에 있는 별장에 백석정 옛터가 있다"는 구절을 발견했다. 추사가 터만 남아 있던 백석정이라는 정자의 부지를 사들인 뒤 새로 건립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사단이 벌어진 것은 그때였다. 종로구청이 정자를 복원하고 그 앞에 있는 연못에 물을 가두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상류에 저수조를 만들어 사시사철 일정량의 물이 흐르게 하겠다는 아이디어도 내보였다.
문화재 복원은 늘 옳은 것일까? 사실 축대만 남아 있을 뿐 고증할만한 자료가 턱 없이 부족한 형편에서 괜히 엉뚱한 모습으로 '상상 속의 복원'을 하면 문화재 복원의 원래 의미만 퇴색시킬 뿐이다. 최근 부암동이 카페와 레스토랑촌으로 변하고 있는 마당에 무분별한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결국 주민들이 반대하고 환경단체 등이 힘을 보태면서 종로구청의 계획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탐방객들이 늘어나면서 자연환경이 덩달아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원 논란은 어떻게 넘겼지만 부족한 시민의식이 백사동천을 멍들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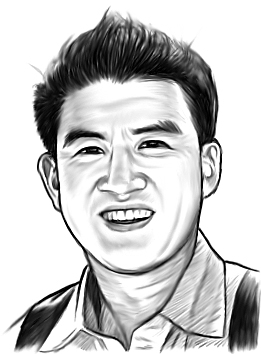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