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에서 숭례문 방향으로 걷다 보면 오른쪽으로 '플라토'라는 미술관을 만나게 된다. 1999년 로댕갤러리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미술관이다.
이 미술관의 미덕 가운데 하나는 '지옥의 문'과 같은 조각가 오귀스트 로댕의 세계적인 작품들을 상설 전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플라토를 찾을 때마다 내 시선을 끄는 작품은 '칼레의 시민'이다.
지난 1871년 프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참패한 프랑스는 자신들의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영웅적인 이들의 동상을 세우는 데 열을 올렸다. 그런 현상은 파리뿐만 아니라 작은 도시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도버해협을 사이에 두고 영국과 마주보고 있는 항구도시 칼레에서도 칼레의 역사를 드높인 이들에 대한 조각 공모를 했는데 당시 조각가로 선정된 인물이 로댕이었다.
그런데 로댕이 실물 제작에 앞서 만든 모형이 시의회와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만다. 약 5백 년 전 벌어진 백년전쟁에서 영국에 저항했던 외스타슈 드 생 피에르와 장 데르, 자크 드 비쌍 등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6인의 모습이 존경스러워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영웅처럼 표현되지도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결국 로댕의 작품은 공모 11년 만인 1895년에야 빛을 보게 되었는데 영웅적인 느낌을 주는 기존 동상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광장 한복판의 바닥돌 위에 받침대도 없이 눈높이로 세워졌으며 타인에 대한 헌신과 죽음의 공포 사이에서 갈등하는 느낌이 풍겨졌다. 애국주의나 영웅주의를 철저히 배제한 듯했다.
로댕은 영웅이라고 해서 늘 확신에 찬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즉 인간 본연의 희로애락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해냈다. 그렇게 함으로써 6인의 인간적인, 그렇기에 더욱 영웅적인 면모를 부각시켰다.
플라토에서 나와 세종로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거기엔 한국인이라면 모르지 않는 이순신장군의 동상이 서있다. 그런데 엄숙함만 두드러질 뿐이다. 2009년 들어선 세종대왕 동상도 오십보백보다. 높은 좌대 위에 올려져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근엄함만 풍길 뿐 고뇌하는 인간의 진면목을 만나기에는 요원해 보인다. 로댕과 그의 사회는 이미 19세기에 넘어선 건데 말이다.
지난 2년 5개월 동안 '권기봉의 도시산책'을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서울을 걷다'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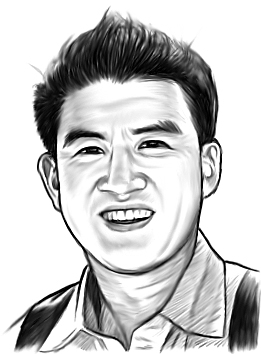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