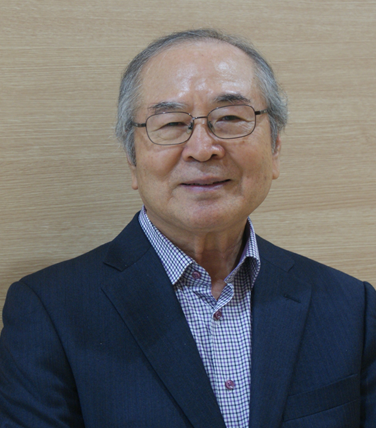
이석우(Ph.D 겸재정선미술관장·경희대명예교수)
이석우(Ph.D 겸재정선미술관장·경희대명예교수)
겸재 정선은 예술정신에서도 퍽 자유로워 그림의 전개와 진전을 살펴보면 끊임없는 변화와 탐구를 모색했음이 드러난다.오늘 날 그의 높은 위상, 심지어 화성으로까지 자리 매김 되고 있는 것도 그의 이러한 예술정신과 자세에 크게 뿌리박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그가 살던 당대에서조차 엇갈리기는 했다. 문화적 기호와 트렌드에 따라서 그 선호가 다르고 더구나 당쟁이 극심하던 그의 시대에 당파성이 배제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당대를 함께 살았던 윤두서(1668-1715)가 정선(1676-1759)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주로 소론계 인사들 이하곤(1677-1724), 조구명(1693-1737), 남태응(1687-1740)등이 이 들이다. 그 이유를 그림의 문인화적 취격이 윤두서가 더 낫다는 것이고, 겸재가 너무 그림 주문에 많이 응함으로 그 선비적 품격이 떨어진다고 본 것 같다.
반면 정선과 교분을 갖고 후원했던 김창흡, 조영석 그리고 소론계 인사들인 김광수, 이춘제 등은 겸재를 더 높이 보고 이병연 같은 이는 겸재와 함께 시화일치사상을 적극 전개하였다.
19세기 전반 무렵에 이르러서 사실성보다는 사의성을 중시했던 예술풍토에서 김정희 등은 오히려 심사정과 윤두서를 더 큰 평점을 주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상황은 바뀐다. 조선의 미술사가들은 서양의 시각으로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것 같고 중국 또는 동아시아적 미론에 따라 왔던 것을 탈피하여 새로운 세계의 맥락에서 보기 시작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오세창(1864-1953)의 '근역서화징'에서의 겸재 평가는 이후 흐름의 토대가 되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겸재가 산수에 뛰어났다. 특히 진경을 잘하여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으니 우리나라 산수화의 종주가 되었고...'
세키노 타다시와 고유섭의 평가가 있었지만 이후 50여 년간 정선에 대한 연구는 잦아든 듯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오면서 자기 것을 찾자는 한국학의 부흥과 함께 겸재는 단연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근대화의 쟁점인 자기 것 찾기, 그리고 내재적 발전과 정체성의 근거를 탐구하면서 겸재를 다시 발견하게 된 것이다.
자연히 진경산수화의 발생이 외래의 영향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재적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는 시각이 중시되었다. 최완수 소장은 소중화주의가 명나라를 대신한 조선이 문화국의 자부심을 갖고 자존심과 자기 발견의 풍토가 진경산수를 이루었다는 주장이 호응을 얻게 되었다. 이에 대해 산수기행예술풍토가 오히려 겸재 산수의 토대가 되었다는 반론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문화가 반드시 자생적이고 독자적이어야만 하는가 하고 묻고 싶다. 문화는 교류하며 조우하며 그런 과정에서 자기 것을 만들어 낸다. 외래적 요소의 영향이 있었느냐의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을 수용하면서 우리 것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만들었느냐에 더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얘기다.
겸재가 서양의 화법에 접했으리라는 몇 가지 개연성이 있다. 중국은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까지 수용하였지만 조선은 아마 50년 내지 1세기정도 후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1720년 연경에 다녀온 이기지(1690-1722)의 '서양화기'가 한 예이다. 이미 서양화의 중국화가 청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 청으로부터 문물유입이 적극적으로 진행된 시기는 숙종조(1675-1720)이고, 이때는 겸재가 활발히 화법을 익히든 시기와도 맞먹는다.
겸재가 관상감 겸교수로 임명된 것이 1716년 숙종42년이다. 당시 관상감은 천문, 지리, 역수, 측우 등에 관한 사물을 관장한 곳으로 서양의 과학과 문물을 가장 먼저 접하고 공부하였을 것이다. 겸재가 여기에서 서양화를 보았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 그리고 관상감 책임자였던 영의정 최석정이 주관하여 서양화법이 반영된 '곤여만국도'를 화원에게 모사시켰다는 사실을 상기해야겠다. 이는 겸재가 그린 '금강전도'에 그동안 막연한 공간으로 남겨두었던 하늘공간 색을 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증거된다.
겸재는 그 외에도 중국의 남종·북종화 등을 자기 나름으로 소화하여 우리 그림, 우리 산수화를 그려냈다. 그는 어떤 면에서 국제적인 포용력의 소유자로 중국의 '계자원화전', '당시화보' 등을 모두 참조하면서 독자적인 우리 산수화를 만들어 낸 창조적 도약의 거인이다. 가장 우리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도 우리 것을 세계적으로 다시 창조해낼 때 가능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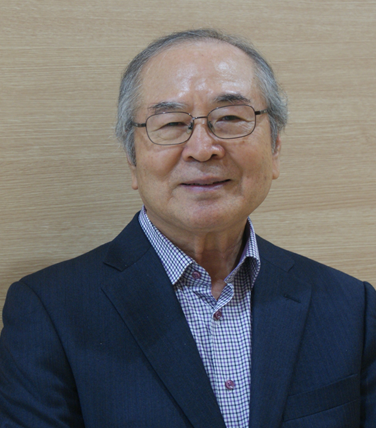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